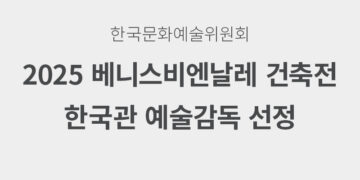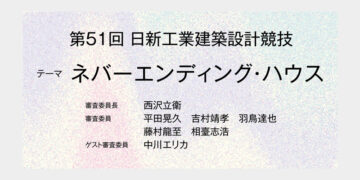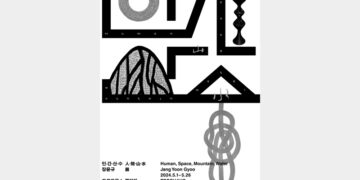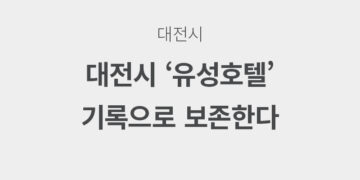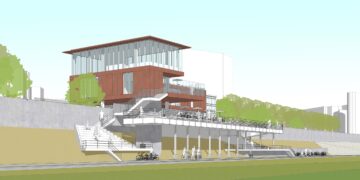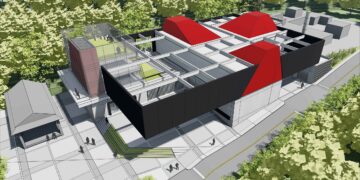글 김소원 기자
기사입력 2023-07-11

소비 중심의 화려한 욕망으로 가득 찬 현대 도시에서, 삶과 자연이 어우러진 건축은 어떤 모습일까?
건축과 공간이 깊이 있는 경험을 선사할 때 우리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특유의 차분하고 따스한 언어로 전해온 건축가 김종진. 그의 네 번째 저서 ‘공간의 진정성’이 출간됐다. 2011년 출간된 ‘공간 공감’의 개정판으로, 이번에는 서른여섯 편의 에세이를 통해 공간의 본질에 대해 얘기한다.
책은 크게 세 장으로 구성된다. ‘거닐고 머무름’, ‘빛과 감각’, ‘기억과 시간’이다.
공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사색은 ‘거닐고 머무름’에서 시작한다. ‘공간을 거닐고 그곳에 머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가 된다며, 그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길라르디 주택’을 소개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이 75세 되던 해에 완성되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소유했었다고 알려진 집이다. 그의 성향대로 미니멀한 디자인과 물, 단조로우면서 강렬한 원색이 특징인데, 자연을 중시하여 마당에는 커다란 나무를, 집 안에는 명상 공간을 두었다. 이렇게 오로지 빛과 색으로 채운 공간은 어지러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준다. 아마도 저자가 말한 ‘영혼의 쉼’을 위한 공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다음으로 저자는 ‘빛’을 주제로 공간의 감각을 논한다. 빛을 활용한 예술가 렘브란트 반 레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작품 속에 표현된 공간을 훑는다. 저자는 이들의 작품에서 ‘시선의 변주’를 포착한다. 화가로서, 감상자로서, 또는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저자의 시선에서 포착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곤 시선을 달리하면 똑같은 빛과 공간도 다르게 경험할 수 있음을,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인식의 틀과 느껴지는 감각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모인 감각은 기억이 되고, 그 순간 모여 추억이 되며, 장소가 된다. 마지막 장 ‘기억과 시간’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 선유도공원이 등장한다. 조선 시대에는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했던 작은 봉우리 섬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암반 채취장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정수장으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장소다. 저자는 이 장소가 지금처럼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이 지나온 긴 세월의 흔적을 지워내기보다는 묵묵히 끌어안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라 말한다. 더불어 공간의 기억을 잇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임을 강조한다.
사람의 삶과 자연의 시간이 흐르는 건축과 공간은 아름답다. 그러한 장소에는 그곳만의 맛과 향기와 소리가 있다. 이를 감각하는 일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깊이 있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사람은 공간과, 자연과 교감한다. 건축가의 진정성 있는 공간에 대한 사색 끝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사람과 세상의 부드러운 조화와 통합.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